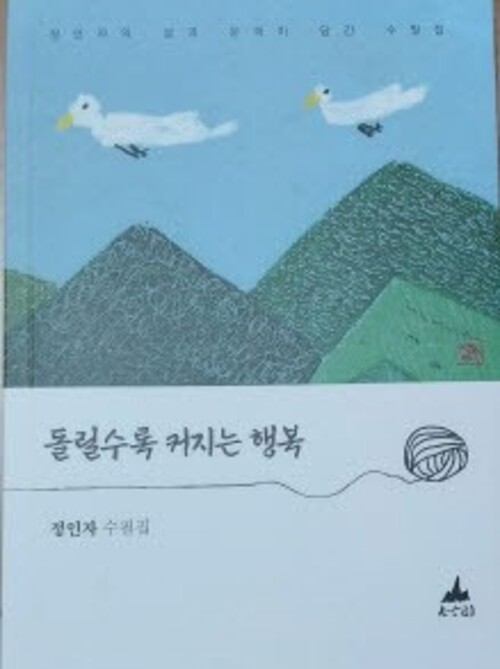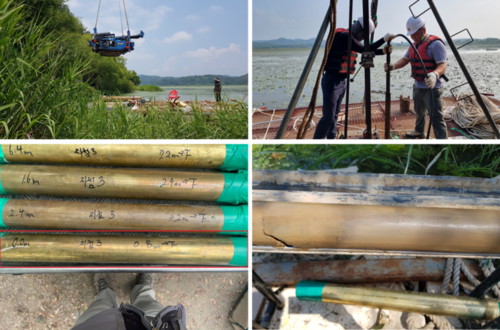[금웅명의 문화기행 – 몽골단상(12-1)] - 옛 도시, 하르호린(Kharkhorin) 가는 길 -
시월 하순.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바람이 불고 간간이 눈발이 비치면서 춥다. 날을 잘못 잡았나 걱정이 앞선다. 기다리던 하르호린(Kharkhorin)으로 답사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꼭 가보고 싶었던 하르호린이다.
익히 들었던, 몽골제국의 수도였고 초원길(Steppe Road)의 옛 도시 카라코룸(Karakorum)이기 때문이다. 몽골제국 초기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 기마 유목민족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통역 첼맥과 운전기사 역할을 할 그녀의 남자 친구가 내 숙소로 차를 몰고 왔다. 북극성 기단의 찬바람이 차가 달리는 도로 위로 흙먼지를 뿌옇게 일으킨다. 렉서스 SUV 차량 좌석은 쿠션이 있어 한결 편하다. 저번 기상청 출장 때 탔던 소련제 푸르공(Furgon)에 비하면 상급이다.
차는 울란바타르 서쪽으로 매끈하지 못한 포장도로를 달린다. 간혹 치즈에 구멍이 숭숭 뚫린 곳과 같은 도로 구간을 만나면 이를 피해 운전한다. 군데군데 공사가 부실해 움푹 파인 곳(포트홀, pothole)이 많은 포장도로이다. 겨울이 길면서 찬 대륙성 기후의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아스팔트의 결정에 생겨난 흠이다.
이곳은 계절에 따라 매우 덥고 추운 까닭에 기온 차가 큰 몽골 고원의 기후 탓인 것 같다. 9월에 접어들어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몽골 입국 첫해에 나는 적이 놀라기도 했다.
한 시간을 달려 일행 셋은 렁(Lung) 마을의 한가로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다. 밥에 양고기와 감자, 그리고 고깃국(슐)이다. 우리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조용한 이 마을을 떠나 계속 포장도로를 달린다.
드넓은 초원길은 흙먼지 풀풀 나는 오프로드 길이다. 차가 달려도 달려도 흙길에 덜컹거려, 엉덩방아로 온몸이 구타를 당하는 것 같다. 누런 풀숲과 어우러진 황톳빛 초원길 주행은 내 몸을 위아래, 좌우로 마구 흔들어 댄다. 저번 출장에 이은 두 번째 지방 여행길이라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이젠 몽골의 지방 여행에 웬만큼 익숙해졌다. 그만큼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보는 것도 별 감흥이 없다.
처음 푸르공(Furgon, 소련산 승합차)을 타고 초원길을 달릴 때, 누런 흙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리는 성가신 존재는 바로 앞차였다. 일행이 탄 차의 시야를 가리고 앞차가 일으키는 흙먼지를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엔 망망대해 같은 적막한 들판에서는 반갑게 동행하는 친구로 느껴지곤 했다.
초원길을 막힘 없이 달리는 것은 주로 푸르공과 랜드크루저 차량이 들판을 헤집고 달린다. 초원에서는 일정한 도로가 없이 차바퀴가 남긴 흙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곧 길인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차창 밖으로, 땅바닥을 부지런히 오가는 작은 들쥐 녀석들이 신기했다. 바닥 이곳저곳에는 구멍이 나 있다. 하늘을 나는 종다리 떼가 차창 앞으로 휘리릭 날아 먼 데로 사라지곤 했다.
첼맥은 운전하는 남자 친구 옆에 앉아 말동무하고 나는 뒷자리에 느긋하게 앉아서 차창 밖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쳐다본다. 마냥 넓고 넓은 누런 풀밭 천지를 지나친다.
기원전부터 스키타이(Scythia) 민족, 흉노, 그 후 훈누(Hunnu), 돌궐(Turk) 등 유목 기마민족이 이 넓은 대륙을 누볐다고 상상하면서 나만의 타임머신 여행을 해본다. 볼가강, 흑해 연안에서부터 이곳 중앙아시아, 시베리아까지 드넓은 대륙은 인간생존은 물론, 면면히 이어온 인류 역사의 중요한 무대였다.
한참을 달려 오후 네 시경, 차는 으기(Ogii) 호수 근처에서 비포장 초원길로 접어든다. 이 길이 하르호린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한다. 초원길의 주행은 덜커덩거리며 나아가는 것이 상식이다. 딱딱한 의자로 갖추어진 푸르공 보다는 쿠션이 있는 차를 타고 있으니 그래도 몸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다. 덜 시달리고 있다.
오후 다섯 시를 넘긴 초원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여섯 시가 되자 붉은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차 안 일행을 침잠의 상태로 몰고 간다. 고요해진 암흑 속으로, 으라차차, 아래 위 좌우로 기우뚱거리는 차 안에서 이젠 용을 쓰며 컴컴한 길을 달려야 한다. 헤드라이트의 불빛에 의존해 먼저 지나간 차들의 차 바퀴 흔적만을 따라가다 보니 잠간 동안 길을 잘못 들기도 한다.
첼맥 남자 친구는 나아갔던 길을 다시 돌아 나온다. 그는 부근에 사는 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초원의 지름길을 확인한 후에야 제대로 방향을 잡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들판 길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감각은 어두워질수록 예민해진다. 밤이라, 꿀렁거리는 차의 진동이 낮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 낮에는 바깥 풍경이 보여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밤길은 헤드라이트 불빛만을 보고 어림짐작으로 줄곧 달리니 신경이 예민해지고 피곤이 몰려온다. 앞으로만 내닫는 차의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건지 슬슬 불안감이 몰려온다. 들판에 난 찻길의 흔적만이 캄캄한 초원의 이정표 구실을 하고 있다.
초원의 밤은 무인지경으로 깊어 가고 일행은 그저 달릴 뿐이다. 탈진 상태의 일행은 이젠 말이 없다. 이윽고 2시간 30분 이상을 달려 8시 40분경 포장도로가 지나는 허던트(Hudunt) 마을 가까이 있는 언덕에 도착했다.
참았던 소변을 들판에 보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은 온통 별의 천지다. 검푸른 하늘에 별들이 바다를 이루었다. 밀키웨이(milky way), 은하수도 군데군데 펼쳐져 있다. 그야말로 돈 맥클린(Don Mclean)이 부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라는 노래 가사 마냥 밤하늘은 스타리 스타리 나잇(starry starry night) 이다.
별들의 합창이 시작된 검고 짙푸른 밤하늘을 배경으로 수천 갈래의 광채가 숨을 멎게 한다. 크고 작은 별들의 홍수가 났다. 몽골초원의 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초원의 밤하늘을 그리워하는가 보다. 밤하늘을 보러 몽골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포장도로에 접어들어 전화로 약속했던 첼맥의 친구가 이 마을에서 일하는 그의 오랜 친구를 만난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하르호린 가는 길을 확인한다. 차 밖의 밤공기는 찬바람을 타고 더 추워졌다. 밤 8시 40분, 안락한 포장도로를 타기 시작한 시각이다.
이곳 허턴트(Hudunt) 마을에서 하르호린(Kharkhorin)까지는 100Km 미만의 거리라고 한다. 간혹 마주 오는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지나간다. 도로 양켠은 컴컴하다. 그래도 덜컹거림이 없는 포장도로는 초원길보다는 양반이다.
얼마나 차의 진동에 시달렸던가. 울란바타르를 떠난 지 거의 열 시간이 되어 간다. 차는 한 시간가량 달려 드디어 몽골제국의 옛 도시 하르호린으로 다가간다. 먼 데서 한 점, 두 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암흑 속을 달리다 불빛을 보니, 어찌 그리 문명의 불이 반갑던지. 마을이 있고 쉴 곳이 있다는 안도감이 든다.
이제 숙소를 찾는 일이 급선무다. 마을 초입에 한 호텔 - 모텔 수준의 2 층 목조건물 - 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는다. 입구 문에 붙은 안내 종이쪽지의 전화번호를 보고 통화하니 그가 이내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주변은 온통 컴컴하기만 한데 잘 곳이 있다니 안심이다. 방 두 개를 잡는다. 숙박료가 방 하나에 40,000 투그릭 이라고 한다. 손님은 우리뿐이다. 엉성한 시설에 샤워는 할 수가 없다. 1층 공동 화장실에 세면대가 놓여 있다. 씻을 수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이다.
젊은 주인 남자가 방에 온풍기를 가져다준다. 한밤중엔 기온이 급작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이다. 침대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 있는 엉성하기 그지없는 방은 널찍하다. 주인은 뜨거운 물 포트와 함께 달랑 녹차 한 봉지와 각설탕 네 개를 컵과 함께 갖다 주고 사라진다. 이게 숙박객 서비스의 전부이다.
방 안 텔레비전 화면은 나오는데 상태 불량이다. 썰렁한 분위기이다. 밤 9시 30분경 침대의 얇은 이불을 두 겹으로 해서 잠을 청한다. 하루 종일 길을 달렸으니 피곤이 몰려온다. 이 마을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피곤에 절어 곤한 잠 속으로 빠져든다.
# ‘하르호린 가는 길’ 2편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금웅명 고문 producerkum@daum.net [MNB (몽골 국영방송국) 방송 자문관 역임]
<저작권자 ⓒ 생태환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Eco 스페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