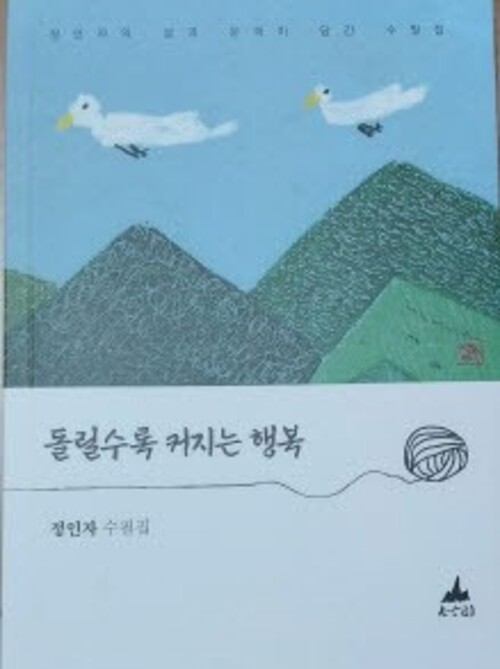|
至이를 지 痛아플 통 在있을 재 心마음 심
지통재심(至痛在心)은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의 고통이 있다. 사랑하는 연인 간 헤어짐의 아픔이 있고 우리 민족처럼 동족 간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이다.
아이유가 부른 ‘미아’ (작사·최갑원 작곡·민웅식,이종훈)의 도입부 노랫말은 지통재심의 정서를 극적으로 대변한다: ‘우리 둘/담아 준/사진을 태워/하나 둘/모아 둔/기억을 지워/’.
화자는 지금 소중한 사진을 태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은 행복한 추억을 상기시키는 매개물이다. 아름다운 회상의 상징인 사진을 불태우는 행위는 더 이상 사진을 추억하고 싶지 않은 노여움과 분개의 표현이다.
이 사진에는 화자와 상대방 연인의 멋진 자태와 애틋한 그리움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귀중한 사진을 화자가 태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그만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진뿐만이 아니다. 연애 시절에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뇌리에 축적된 찬란한 ‘기억을’ 화자가 이제 모두 지우려 하고 있다.
이토록 추억과 기억을 각각 태우고 지우려는 화자의 아픔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것은 그와 자신의 연인이 다름 아닌 이별의 종착역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헤어짐의 종착역을 지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일 수도 있다. 화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별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별의 아픔을 훌훌 털고 ‘그만 일어나 가야 하는’ 사실도 역시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인을 잊으려고 애를 써 보아도 소용없다. 따라서 그는 힘에 겨워 이렇게 독백한다:
‘왜/난/주저앉고 마는지/’. 화자의 처절한 아픔은 절정에 도달한다: ‘쏟아지는 빗물은/날/한 치 앞도/못 보게 해/몰아치는 바람은/단/한 걸음도/못 보게 해/’.
억수같이 퍼붓는 빗물이 화자의 시야를 가로막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다. ‘한 치’는 산술적으로 약 3.03cm에 해당하는 길이이다.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화자의 오리무중 상황을 은유한다.
또한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화자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지통재심 상태를 처절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영육 간 몹시 위태로운 지경인 백척간두의 처지에서 화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무섭고 두려워 온몸이 떨리고 있다.
이때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두 손을 모아 피를 토하듯이 연인을 향해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는다.
이제 화자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아무리 쥐어짜도 눈물이 나오지를 않는다. ‘울먹일 힘마저’ 없을 만큼 절대적 상실감에 젖어 있다. ‘이별’은 ‘꿈’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임을 이제야 화자는 인식한다.
그리고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연인과의 별리가 허상이 아니고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통감에 휩싸인 화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아쉬운 미련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한다:
‘아픈 내 가슴도/깊은 상처들도/나쁜 널/미워하는데/사진을 태우고/기억을 지워도/널 잊을 수 없나 봐/사랑해/’.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리의 아픔이 클수록 도저히 연인을 망각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다. 연인을 잊으려 할수록 미움보다 오히려 사랑했던 추억이 되살아나는 화자의 애절함이 들려오는 듯싶다:
‘작은 두 손을 모은/내 기도는 하나뿐이야/돌아와/돌아와/’.
지통재심은 조선 효종이 청에 패전해서 나라와 백성의 수모를 씻지 못해 애통해 하는 마음을 신하에게 비답(批答)한 표현 어구의 일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통재심을 경험한 다른 사례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4명의 아까운 생명들을 잃은 지극한 아픔이 온 국민의 마음에도 있다. 2022년 15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도 지통재심의 상처로 남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쓰라린 이별의 아픔을 어찌 필설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인용한 곡목 ‘미아’의 노랫말처럼 사진을 태워도 기억을 지워도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지독한 아픔을 가슴에서 영원히 잊을 수는 없을 듯싶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고재경 전문위원 (배화여대 명예교수,영문학 박사/작사가)
<저작권자 ⓒ 생태환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Eco 에세이 많이 본 기사
|